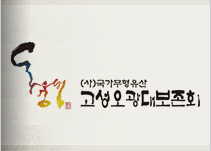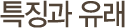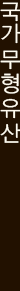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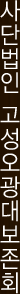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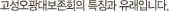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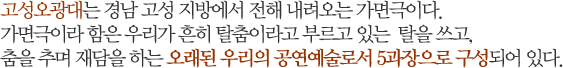
 오광대라는 뜻은 다섯 마당(5과장)으로 놀아지기 때문이라는 말과 다섯 명의 광대가 나와서 노는 놀음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가운데 5과장으로 구성된 것은 고성의 경우이고 다른 지역은 다르게 구성된 경우도 있어 경남 일대의 모든 탈놀이의 이름으로 설명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후자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오방)를 상징하는 다섯 광대가 나와서 하는 놀이가 주가 되었기에 이것을 근간으로 오광대라는 명칭으로 두루 쓰이게 된 것 같다.
오광대라는 뜻은 다섯 마당(5과장)으로 놀아지기 때문이라는 말과 다섯 명의 광대가 나와서 노는 놀음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가운데 5과장으로 구성된 것은 고성의 경우이고 다른 지역은 다르게 구성된 경우도 있어 경남 일대의 모든 탈놀이의 이름으로 설명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후자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오방)를 상징하는 다섯 광대가 나와서 하는 놀이가 주가 되었기에 이것을 근간으로 오광대라는 명칭으로 두루 쓰이게 된 것 같다.고성오광대의 역사는 조선 말 고종 30년(1893년) 고성의 부사로 부임한 오횡목이 음력 12월 30일 제석을 맞이하여 읍내에서 벌어진 세시행사를 목격하고 이 광경을 고성 총쇄록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풍운당을 돌아다보니 이정의 무리들이 나약을 갖추고 유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무어냐고 물으니 "해마다 치르는 관례입니다." 라고 한다. 또 "오래된 관례"라는 아전의 말을 좆아 찾아보면 오래된 문헌으로 1530년(중종25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의 기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탈놀이다.
또한 조선 말 당시 고성 지방에 괴질이 크게 번졌는데 이때 남촌파 선비들이 고성읍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거리에 있는 무이산(청량산)으로 피병을 간 일이 있는데 그 때 시조나 노래와 함께 차츰 오광대놀이를 놀았다고 하며, 고 이윤희, 고 정화경 두 분이 잘 놀아 중심이 되고 김창후 옹과 그 밖의 15~6명의 젊은이들이 기능을 배우고 연마하였다고 한다.
또한 1920년에는 정화경, 이윤희 명인이 나오고 이들은 김창후, 홍성락, 천세봉 명인에게 예능을 대물림 한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식민지 상황이었다. 백성의 생활상은 수탈정책으로 점차 피폐해져 갔다.
해방이 되자 곧 세 분 명인은 분주히 오광대의 모임을 규합하고자 발 빠른 행보를 하였다. 그 첫 열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있었다. 당시에 최신식 건물로 가야극장이 개관하였는데 낙성식 기념공연으로 고성오광대놀이를 공연한 것이다.
해방 후 탈놀이가 복원되어, 빠른 것이 대략 1950년대 후반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고성의 1946년 공연은 가면극 부흥의 시대를 앞당긴 매우 의미 있는 공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탈춤으로서 현존하는 영남형 탈춤 중 가장 그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으며 극보다는 춤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